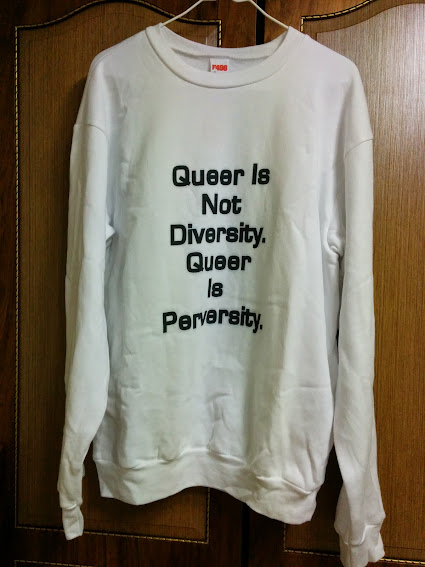공연을 보러 마포아트센터에 갔다. 마포아트센터라니, 나로선 마포문화체육관이란 명칭이 더 익숙하다.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땐 마포문화체육관으로 부르더니, 몇 년 지나 뜬금없이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했었다. 영어로 명칭을 바꾸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걸까? 무슨 이유에서일까?
명칭의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건, 마포아트센터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 아니다. 이번이 고작 두 번째다. 전혀 다른 이유, 마포아트센터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다. 걸어서 1분도 안 될 거리에서 자취를 했다.
마포아트센터 근처, 듬성듬성 있는 아파트 사이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다. 혹자는 그곳을 두고 “무슨, 달동네인 줄 알았다. 지금도 저런 동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.”라고 했다. 경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곳. 이태원의 보광동이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서, 혹은 인종차별주의로 경찰이 수시로 감시하는 곳이라면 마포아트센터 근처는 그냥 방치되는 느낌이었다. 그런 곳에서 미국바퀴가 날아다니는 것만 빼면 나는 무척 잘 살았다. 2년을 채우고 바로 이사를 했지만 미국바퀴를 피하려는 이유에서였다. 명절에 본가에 갔다 오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화장실의 작은 창문을 약간 열어두면, 귀가했을 때 화장실 변기 안에 죽은 미국바퀴가 두어 마리는 있고 바닥에도 죽은 미국바퀴가 몇 마리 있곤 했다. 미국바퀴가 싫어서 혹은 무서워서 이사를 했지만 나는 괜찮은 동네라고 여겼다. 그 동네를 떠나고도 한동안 그 동네가 그리웠다.
마포아트센터를 찾은 김에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다. 동네는 여전히 낡았고 한적했다. 살던 집으로 가니 내가 살던 방 위에 있던 창고(?)의 일부분이 헐어져 있었다. 그곳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면, 방에 있던 나는 우다다하는 소리를 들었지. 동네 분위기는 어쩐지 재개발을 앞둔 느낌이었다. 붉은색 락카로 번호가 적혀 있었고 철거 예정을 알리는 문서가 문 앞에 붙어 있었다. 그리고 어느 한 곳 불켜진 곳이 없었다.(다음날 다시 방문했을 때 불 켜진 집이 한 곳 있었다.)
얼추 10년 전이다. 그때 나는 많이 힘들었다. 잠깐이지만 본가와 완전히 연락을 끊기도 했고,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휴학한 다음 창고정리알바를 하기도 했다. 이런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. 마음이 안 좋았다. 마음이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다. 여전히 열광하는 뮤즈(Muse)와 니나 나스타샤(Nina Nastasia)를 들으며 간신히 버틴 시기기도 하다. ‘루인’이란 이름을 처음 만들고 사용한 곳/시기이기도 하다. 장마철 습기로 모든 옷에 곰팡이가 연하고 넓게 피었고, 옷에서 튿어진 실밥을 없애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옷에 핀 곰팡이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내 몸도 불에 탈뻔 했었다. 그리고 팔에 붉은 꽃이 여러 번 피었다.
내겐 생생한 느낌인데 벌써 10년 전이라니. 어쩐지 기분이 묘했다. 언젠가 나는 또 다시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문간방에 살 수도 있고, 지금과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든 삶을 유지할 수도 있다. 아무래도 상관없다. 어떤 곳이건 나는 또 좋다고 살아가겠지. 그저 10년 전의 나를 만나는 것 같아, 기분이 묘했다.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?


위에 부서진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인다. 그 아래, 문간방에서 살았다.


위에 부서진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인다. 그 아래, 문간방에서 살았다.